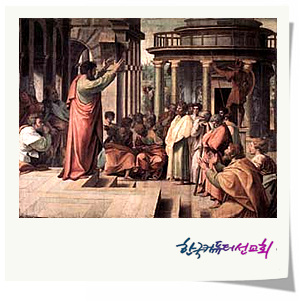 종교철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종교들과 종교생활을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처럼 순수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한 특수 ·종교의 사상적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서술하는 것을 본래적 과제로 하는 입장을 말한다. 혹은 다른 이해의 지평과 관점에서 종교철학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① 구성적이고 조직적이며 그래서 완전한 체계적 이해를 요청하는 유형과, ② 감수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종교철학의 유형이 그것이다. 첫째 유형은 보통 구성적(構成的) 종교철학이라 부르고, 둘째 유형은 수용적(受容的) 종교철학이라고 부른다.
종교철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종교들과 종교생활을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처럼 순수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한 특수 ·종교의 사상적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여 서술하는 것을 본래적 과제로 하는 입장을 말한다. 혹은 다른 이해의 지평과 관점에서 종교철학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① 구성적이고 조직적이며 그래서 완전한 체계적 이해를 요청하는 유형과, ② 감수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종교철학의 유형이 그것이다. 첫째 유형은 보통 구성적(構成的) 종교철학이라 부르고, 둘째 유형은 수용적(受容的) 종교철학이라고 부른다.
구성적 종교철학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규명보다는 종교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Was-Sein-Soll), 또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한다(Was-Sein-Muβ)는 보다 당위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의 충족이유율(充足理由律)을 그 과제로 하는 종교에 대한 철학적 연구이다. 이는 독일 관념론의 종교철학적 입장에서 이해되며 이성에 의한 종교의 기원설(I.칸트), 순수 인간학적인 요청(L.포이어바흐), 문화의 본질(P.틸리히) 등으로 종교의 본질을 추구해간다.
따라서 종교는 신앙과 계시(啓示)에 뿌리를 두는 종교의 신앙심과는 대립된 입장이다. 이런 종교는 철학적 종교, 도덕적 종교, 혹은 이지적 종교의 입장을 철학화한 것이다. 그 반면에 수용적 종교철학은 독일 관념론 이후에 나타난 종교철학의 유형이다. 이 이론에서는 경험적 종교, 즉 주관적 종교경험이 종교철학의 자연적 대상 혹은 객관을 형성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종교현상을 실증과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종교학이나, 특정 종교 내에서 그 종교의 교리를 검토하는 신학·교의학과는 다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철학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세계를, 경험을 넘어선 형이상학적 이념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종교가 인간의 감각적·오성적(悟性的)인 경험을 넘어서 피안이나 신에 대한 통로를 여는 것이라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철학에서는 철학 그 자체가 일종의 종교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중세 교부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은 글자 그대로 종교철학을 중핵으로 삼았다.

